신간 ‘통찰지능’ 출간···“자신이 만든 한계 벗어나기 위한 최적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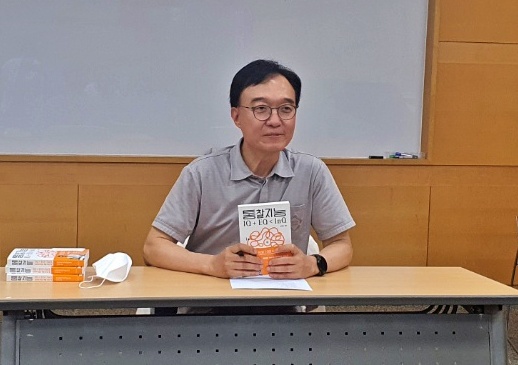
“이 책은 제가 평생 동안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데이터를 정리해 완성한 ‘통찰학 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찰’에 대해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사진>는 최근 의사신문과 만나 최근 자신이 출간한 새책 ‘통찰지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나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통찰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내리기조차 쉽지 않다. 통찰(洞察)의 사전적 정의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지만 이 말만으론 무언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최 교수는 ‘통찰’에 대해 한마디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며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전체를 추론해 내는 것으로 ‘관찰’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경험으로부터 얻는 후견지명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바로 ‘통찰지능”이라고 덧붙였다. 통찰지능은 원래는 없는 단어이지만 최 교수가 지능지수(IQ)와 감성지수(EQ)를 합쳐 ‘세상살이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라며 새로 만든 단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그가 왜 이처럼 통찰지능에 천착하는 것일까? 이는 의료 현장만큼 통찰이 필요한 곳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지식은 그것만 보이지만 통찰은 잊혀지지 않아요. 사실 의사들이나 환자들이나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입짧은 아이를 보이는 것만 보고 병원에 데려가고 의사는 약주고 검사하며 더 먹이려고만 하죠. 그러면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이들은 배가 아프고 구토를 하는 등 ‘신체화 장애’를 겪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진심어린 몇 마디만 나누면 눈물을 흘리며 바로 증상이 좋아지곤 합니다. 통찰을 통한 효과죠. 이러면 약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통찰지능’은 결국 휴머니즘에 관한 책이다. 책 내용엔 우리나라 의료계 맹점 같은 것도 나온다. 의사를 블랙컨슈머의 관점에서 비판하기도 하고 의료를 밴딩머신으로 취급하는 세태를 비판하기도 한다.
“사실 스테로이드도 의사 입장에서만 약이죠. 일단 먹으면 무조건 좋아지니까 끊었다가도 다시 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두려움을 피하는 게 우리 의료시스템이라서 대부분 좋은 약을 먼저 쓰고 시간이 흐르면서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힘든 약일수록 먼저 쓰고 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죠.”
그는 현행 의료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좋은 약들의 보험급여 기준이 대부분 3달을 버텨야 쓸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쉬운 길을 택해서 환자들이 고통을 받죠. 또 크론병 환자 진료는 3분, 과민성장증후군은 15분이 걸리지만 3분 진료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결국 설명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수록 보험 수가도 더 올려줘야 합니다.”
이 책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통찰지능을 수행하는 10가지 방법. 최 교수는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명분과 실리를 조화시키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책이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며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인 지능지수(IQ)와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인 감성지수(EQ)를 조화시키는 능력도 훈련을 통해 점점 더 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의대 학장을 맡아 우리나라 최초로 ‘인성 중심의 절대평가제를 지난 2020년 도입하기도 한 최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의학지식만으로 환자를 보면 환자가 다친다.”
최 교수는 “통찰은 결국 남의 마음을 읽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럴려면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실수인 책읽고 혼나는 과정을 무서워하지 말고 부딪혀야 한다”면서 “직접 부딪히고 창피도 당해보면서 ‘통찰지능’은 더 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진료하는 의사인 그가 늘 마주치는 것은 아이들과 부모의 나쁜 기억. 그러나 나쁜 기억은 마음먹고 부딪히면 산산조각 낼 수 있다. 다만 부딪히려는 적극성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걸 덮어쓸 만한 좋은 기억도 계속 마련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연호 교수는 “이렇게 자신의 기억을 하나둘 안아 주다 보면 우리 뇌는 삶을, 타인을, 자기 자신을 점점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며 “기억을 바꾸는 삶이 이 책 전반에 걸쳐 펼쳐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