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 30년, 눈부신 발전…위급 환자 치료 선봉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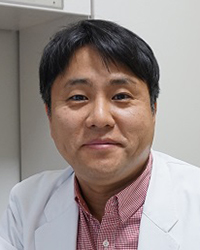
“응급의학 30년”
올해가 마침 응급의학이 탄생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서울시의사회와 같은 해에 축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응급의학이라는 네글자를 익숙해 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익숙함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공존할 것인데 그러한 면을 떠나서 이게 공공의료적 서비스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것은 모두 공감해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
응급의학은 30살이 되었지만 실제 응급의학의사가 응급실과 응급의료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에 관여한 지는 20여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솔직한 역사이다. 응급의학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필요성이 인지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성수대교붕괴와 백화점붕괴와 같은 대형사고 이후 태동한 것을 모든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고이후 그냥 모든 의사가 응급실, 특히 응급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포기 선언이 먼저 있은 후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면에는 끊임없는 몇몇 선구자적 의사들의 노력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가미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도 응급의학은 이러한 태생과 별반 다르지 않게 다가왔다. 가족들에게도 생소한 이름 “응급의학”. 모두에게 전공의 선택 시 이야기했을 때 반응들은 비슷했다. “그게 뭔데?”, “왜 그런과를?”, “무슨과라고?”… 등등. 처음 전공의가 될려고 할 때 면접에서 어느 타과 노교수님의 질문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 “응급의학을 한다고? 첫 전공의가 되는 구만, 그런데 며칠밤을 잠을 안자고 근무할 수 있나?” 였다. 조금 이해안되는 질문이었지만 “선생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면접 후 많이 씁쓸했던 기억이 생각난다.
응급의학의사로 살아온 시간동안 가장 이 과의 매력이 뭐냐고 물은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가장 의사다운 치료를 하는 과다”. 우리과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있고 아시아인들이 좋아한다는 보톡스, 레이져 등은 없다. 하지만 솔직한 환자는 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은 꾸밈이 없다. 아픈 그 상태로, 씻지 못하고, 피흘린채로 온다. 그래서 좋다. 우리는 그 환자들을 짧은 시간동안 빠른 검사와 처치를 진행해서 안정되게 해준다. 지혈을 시키고, 청진을 하고, 격양된 언행을 안정시키고, 가장 빨리 치료되는 약을 사용해서 생명을 지키는 일. 그게 바로 응급의학이다.
하지만 이게 바로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환자의 여러 상태에, 의사인 나도 같이 화나고, 슬프고, 귀엽고, 기쁜 마음이 근무시간 내내 수십 차례 반복되는 특이하고 힘든 감정적 이상상태에 빠지기 쉽다. 미국과 달리 환자 사이 간격이 거의 없는 국내 실정에 옆환자에게 보인 감정상태를 다른 옆환자에게 그대로 보여서는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어려운 걸 해내는 과다. 가히 감정노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서툴러서 전공의 시절엔 많이 힘들어했다. 지금의 전공의들도 하늘의 특별한 능력을 타고 나지 않는 한 12시간에서 24시간 꼬박 진료를 하며 이러한 감정적 조절은 쉽지 않다.
또다른 어려움은 환자의 상태보다 환자의 처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었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환경을 드라마 같은 데에서는 매회 진행되면서 충분히 주인공과 다른 이들의 상황이 이해되게 만들지만 고작 1시간 이내에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진행의 큰 틀을 잡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환자의 모든 처치와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원활히 쌓기 힘든 부분이 많다. 특히 젊은 시절에 아버지뻘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기가 쉽지 않고 오해를 불러올 많은 요소들이 있다보니 현재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폭행이나 싸움이 번번히 일어날 수 있고 심하면 의료분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술에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의 실정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치료를 하면서 힘든 경우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이 응급의학 의사들을 더 힘들게 할 때도 많다.
한창 교수가 되어 응급실을 지켜나갈 때 전문의가 두명이었고 세명이 되고, 네명이 되고 이제는 11명의 전문의가 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물론 그렇다고 일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다. 공공의료적 성격의 과여서인지 너무 많은 인증평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응급의학의사로 살아가는 내 자신은 한없이 멋지고 자랑스럽다. 그만큼 보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응급의학이 시간이 갈수록 더 발전하는 멋진과가 되기 위해 나자신부터 오늘 열심히 응급실을 지킬 것이다.


